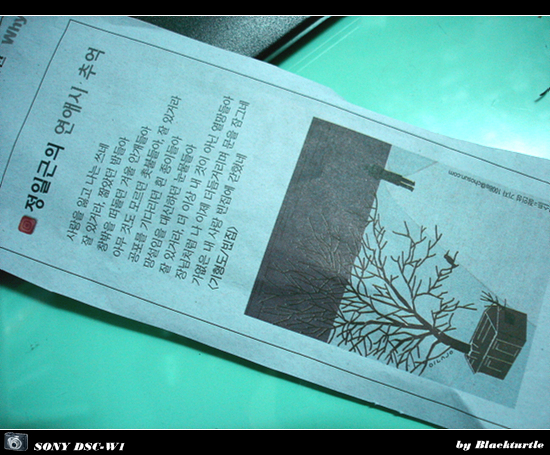
원래 저번주부터 포스팅을 하려고 끙끙댔었는데, 이제야 포스팅한다.
무슨 기자도 아닌데, 항상 쓸거리들이 머리 속에서 줄줄 나오고, 그러다 지나가는 쓸거리들 역시 한,두개가 아니다.
마감에 시달리는 기자들이 이해가 되는 '나'이다. ;;
책보다 신문을 좋아하는 나는 늘 그랬듯이 신문을 보았다.
정치면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챙겨보다가 지금은 손을 놓았다.
대신 경제면을 주로 보는 편이고, 종종 문화 쪽을 보곤 한다.
사실 위 시를 보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보았던 것은 아니고 그 옆 아래에 블랙홀에 관한 글이 있길래 낼름 보려다가 이 시가 보였다.
이럴 때면.
"아니다. 난 공학도다!"
라는 쓸떼없는 주입을 내 머리에 넣는다.
그리고는 다시 블랙홀로 머리를 돌린다.
하지만 시,시,시..라면서 머리 속을 빙빙 돌고 있다.
블랙홀을 재빨리 읽고 시를 읽었다.
사진도 올렸으나 여기에 직접 타이핑해본다.
사랑을 읽고 나는 쓰네.
잘 있거라, 짧았던 밤들아.
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
아무 것도 모르던 촛불들아, 잘 있거라
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
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
잘 있거라,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
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
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
뭐, 그렇단다.
원래 음악이건 시건 영화건 그 어떠한 것이던 '사랑'에 관해 논하는 것들은 외적으로는 꺼리는 편이다.
"그런 하찮은 것들을 다루다니."
라면서 자의식을 일으키는 편.
그러나 저 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'숨김'이다.
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세상의 글들 중 가장 함축적인 글이기 때문일 것이다.
전에도 포스팅했지만, 진정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자들은 입 밖에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.
그런 이유로 위 시도 마음에 와 닿았다.
겨울 안개, 촛불, 종이, 눈물들..
모두 하나 같이 위 시를 쓴 기형도 시인에게는 남다른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사물 하나만 바라봐도 수많은 장면들이 머리 속을 스쳐갈 것이다.
머리는 쓰러지되 간신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듯.
그렇기 때문에 위 시가 아름다울 수 있었다.
바른대로 기형도 시인이 겪은 얘기를 즉, 저 시의 함축적 의미들을 모두 풀어해쳐 한 편의 소설이 되었더라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다.
그냥 연민이 갈 뿐이 된다.
나래에게 이 시를 보여줬다.
시를 읽는 데에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.
그 뒤에 돌아온 대답은?
"아, 뭐야. 어려워."
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가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라며 교과서를 펴 주었다.
교과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는 주구장창 장문의 글이었다.
"난 이런 시가 좋아. 이해하기 쉽잖아."
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속으로 되새기며, 그렇기 때문에 시가 아름다운 것이다.
시를 시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시가 어려운 것이고, 진정한 비참함 속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.
대충 마무리.
[까만거북이]
'Ver 1.0 글 모음 > Ver.2.0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난 이래서 소니에게 희망이 있다고 본다. (5) | 2007.11.10 |
|---|---|
| 조나다에 대한 생각. (2) | 2007.11.10 |
| 산요 에네루프 충전지 (0) | 2007.11.10 |
| 노트북을 치우다. / 윈도우즈 FLP 설치기. (8) | 2007.11.10 |
| 아범시리즈의 대단함을 알다. (2) | 2007.11.09 |


